지난 7월21에 신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모두의 광장에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참조: 본 홈페이지 최근 게시판이 “운행차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 제안”)
어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내연기관차량(약 2천만대) 감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환경부에서도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해야한다는 제안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에도 주요 배출원에 대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감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조기폐차(4~5등급 차량), 전동화 개조사업(1톤 화물차)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 대책만으로는 현재 2천만대 이상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차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추가적인 저감사업 및 전동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해주시면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또는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답변을 보면, 환경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감축” 정책 방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이미 일부 정책을 진행중 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가 제안을 하면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중요하다.
이제 가야할 길이 조금 보인다. 다음과 같은 고민 과제가 떠오른다.
- 긍정적인 부분
– 정책 방향 공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감축 필요성 인정.
– 현재 정책 연계성: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에 이미 동시 감축 전략 포함.
– 추가 제안 수용 의사: 새로운 저감사업·전동화 방안을 제안하면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
- 한계와 기회
– 현 대책 한계 인정: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2천만대 내연기관차의 획기적 감축이 어려움.
– 기회 요인: “추가 제안”을 명시적으로 요청 → 향후 후속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 높음.
– 정책 경로: 국정기획위원회 → 소관 분과위 → 국정과제/부처 정책 반영 여부 검토.
- 향후 대응 전략
(1). 기조의 명확화: 3대 핵심전략(3C)을 기조정책 축으로 공식 채택
|
전략명 |
정의 |
핵심 목표 |
| Clean Air (청정대기) | 대기환경의 질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 | 초미세먼지 저감, 운행차 관리, 산업 배출 제어 |
| Circular Economy (순환경제) |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최소화 | 자원순환율 제고, 재제조·리사이클 산업 육성 |
| Carbon Neutrality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균형시켜 순배출 0 실현 |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감축+흡수+전환 |
(2) 추가 제안서 작성: 기존 제안의 범위를 확장해, 외부사업 크레딧 제도와 연계 등 검토
(3) 재원방안 제시: 유류보조금, 일몰제 등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 방안(국비·지방비·민간투자) 명시.
(4) 정책연계: 정량적 효과 분석, 미세먼지(PM10·PM2.5) 및 CO₂ 감축량 수치화, 정책 시행 시 5년·10년간 효과 예측 시뮬레이션.
(5) dMrv 기반 시범사업 제안: 신정부의 탄소배출권시장 강조와 연계하여 추진방안 제안, ‘그린뉴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공통 크레딧제도 도입
(6) 민관 협의체 확대구성: 기술기업·차량정비업·물류업체·지자체가 참여 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안 제시. 협의체 참여기업 중심의 인증, dmrv 연계 추진 등(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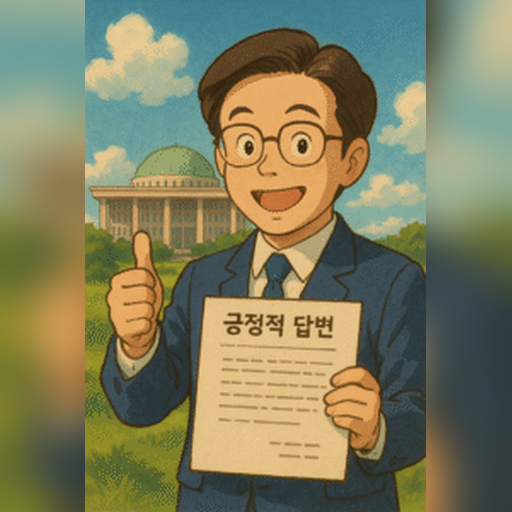
답글 남기기